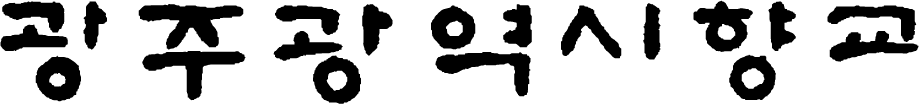- 향교 소개
- 향교 연혁
향교 연혁
향(鄕) 은 수도를 제외한 행정구역을, ‘교(校)’는 학교를 의미하므로, 향교는 지방의 학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향교는 성현봉사(聖賢奉祀)와 지방교육을 위해 고려시대부터 설립되었습니다. 조선왕조는 유학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향교의 기능을 강화했으며, 봄과 가을에는 성현들의 제사를 올리고, 명륜당에서 유학을 강학하였으며, 유생들은 동재와 서재에서 기숙했습니다.
향교는 조선왕조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제사를 모시는 기능을 이어갔고, 광복 후에는 성균관과 함께 교육입국에 앞장섰습니다. 성균관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교육의 중추를 맡아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한 곳이 바로 향교입니다. 향교는 오늘날의 국립 중등 교육기관에 해당하며, 향학(鄕學)으로도 불렸습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이 처음 제도화된 것은 유교가 중국에서 전래된 이후로,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뒤 각 지역에 설립한 ‘경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당에서는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궁술(弓術)도 가르쳐 문무(文武)를 겸비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제와 신라에도 유학이 흥성하여 백제에서는 오경박사(五經博士) 제도를, 신라는 태학(太學)을 설치하였으나, 지방 학교가 건립되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에 비해 영토가 좁고 인구가 적어 지방에 별도로 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지방교육이 이전보다 확대되었으나 완비된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광주향교는 1985년 2월 25일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제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광주향교는 1393년(태조 7년경)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하고 지방 교육과 백성 교화를 위해 서석산(瑞石山, 무등산) 장원봉(壯元峰) 아래에 처음 창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석산 일대에 호환(虎患)이 빈번해 광주읍성 동문 안으로 옮겼으나, 지대가 낮아 홍수 피해와 소란스러움으로 인해 교육 장소로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1488년(성종 19년), 현감 권수평(權守平)이 부임하여 광산현(읍치) 서쪽 2리인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의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1597년 정유재란으로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1600년에 재건되어 현재의 광주향교 모습이 되었습니다.1974년에는 대성전을 보수·단청하였고, 1976년 동·서재, 1978년 명륜당, 1981년 담장과 외관을 수리하였습니다.
현재 광주향교에는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양사재(養士齋), 비각(碑閣), 동무(東廡), 서무(西廡), 동재, 서재, 내삼문(內三門), 외삼문(外三門) 등의 건물이 현존합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5성(五聖), 송조 6현(宋朝六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춘기와 추기에 유교 성인의 제사인 석전대제를 봉행하며 분향례를 진행합니다. 광주향교는 지방 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189종 306책의 경서와 문집류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역대 전교
| 대 | 년도 | 성명 |
|---|---|---|
연혁 추가
×연혁 수정
×